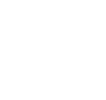언론속의 강태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돋보이는 두 나라가 있다. 독일과 중국이다. 독일은 유럽의 엔진, 유로존 위기의 버팀목이라 불리며 국가경제의 모델로 떠올랐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전망 속에 미래 최대 부국으로 점쳐진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 높은 제조업 경쟁력이다.
독일의 저력은 고기술, 브랜드 신뢰도, 합리적이고 깨끗한 국가 이미지가 결합된 소프트파워이다. `독일산`이 오늘날 고품질과 혁신의 동의어가 된 것도 이 때문이며, 독일 경제력의 공신은 단연 세계 시장점유율 1~3위인 1300여 선진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히든챔피언` 덕분에 독일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5.9%의 최저실업률과 연 3%대 성장률을 보였고, 수출은 1조유로를 돌파했다.
독일 제조업의 기반은 많은 나라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 기술력을 키우고 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도한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다. 정권을 초월한 정책 추진도 주목된다. 2003년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어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독일 경제의 동력인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성장을 위한 감세, 복지개혁을 이끌어냈다.
중국의 제조업은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아웃소싱 생산기지를 일컫는 `세계의 공장`에서 출발했다. 이들 아웃소싱 공장에서 기술력을 키운 중국은 2005년 경제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뿌리산업과 첨단산업 등 제조업의 기술 국산화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중국은 제조업 규모 세계 1위에 올랐고, 세계 2위 연구개발(R&D) 투자국이 되었다.
두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는 지금 자국 내 제조업 살리기에 나섰다. 미국에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일고 있다. 최근 셰일가스 붐도 미국 내 에너지원가를 낮추고 석유화학산업 회생과 제조업 부흥을 견인하고 있다. 가전업체 GE가 일부 생산시설을 이전 중이고, 애플은 맥컴퓨터 제조시설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영국도 지난해부터 선진 제조업 정책으로 9개 대학에 제조업 혁신센터를 만들었고, R&D 투자액의 세금감면 등 공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선진국의 `고가고사양` 생산품과 신흥국의 `저가저사양` 제품 사이에 갇혀 있던 우리 제조업은 이제 중국의 혁신경제가 생산하는 저가고사양 제품들에도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어느 틈에 우리의 대표업종인 전자, 자동차 등을 추격 중이고, 태양광, 제약 등 신산업 분야는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섬유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섬유산업은 1970~1980년대 수출 한국의 효자종목이었다. 그러나 중화학, 전자 등 새로운 분야가 부상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자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며 외면받았다. 한ㆍEU, 한ㆍ미 FTA의 수혜로 올해 20년 만에 수출 증가세로 돌아서며 재도약 기회를 맞았지만, 국내에는 생산 전문인력조차 부족하다. 지난 20여 년간의 제조업 공동화가 서플라이 체인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타개책은 제조업 혁신뿐이다. 뛰어난 기술이나 우리 문화와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만이 세계시장의 강자로 남는 길이다. 이런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국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실업난과 중산층 붕괴를 막아줄 제조업 혁신에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테크노크라트의 공헌도 요구된다.
우리 문화와 융합된 창조적 선진 제조업이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사명감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독자기술을 이끌어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다.
[강태진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