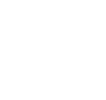언론속의 강태진
[창간인터뷰④]강태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인터뷰 = 김훈기 더사이언스 편집장
정리 =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WCU) 정책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한국 대학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태진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은 정부가 향후 5년간 8250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WCU 정책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WCU는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에 초빙해 학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강 협의회장은 “대학들이 단순히 돈만 따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이용하지만 않으면 무척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감각을 갖춘 기술인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공학 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협의회장은 “글로벌 공학 교육센터는 해외 플랜트 건설에 투입될 인력들을 교육한다”며 “전국 각지에 이 같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협의회장은 대학의 낡은 기자재를 언급하며 “공학 교육은 우수한 인재와 교수뿐만 아니라 뛰어난 교육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의 성과를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WCU는 국내 대학 국제화 기회…유연한 평가기준 필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WCU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온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학들이 단순히 돈만 따오려고 급조해 준비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만 방지한자면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본다. 국내 대학의 선결 이슈가 국제화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WCU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대 공대는 ‘미디어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지원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의학과 공학의 융합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음대, 미대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한 평가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감각 갖춘 엔지니어 육성”
-최근 글로벌 엔지니어를 키우려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의 유망한 엔지니어와 1대1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바로 글로벌 공학교육센터다.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것은 물론 전공에 대한 발표 능력, 경영자적 자질까지 기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이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 것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재학 중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방학 때 몇 주간 리더십 프로그램 형태로 수강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중동에는 엄청난 오일 달러가 쌓이고 있다. 막대한 돈 대부분이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투입된다. 예전에는 항만, 도로 위주였지만 요즘에는 발전소, 통신망, 정유공장을 짓는다. 기계공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글로벌 엔지니어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앞으로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1년에 500명의 엔지니어가 글로벌 인재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시작해 영남, 충청, 호남 등에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도 세계를 누비며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나.
없다. 다만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본이 중동에서 엄청난 달러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공학은 비싼 교육…인프라 개선 시급”
-공학 교육 현장에서 교수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볼 점은 없다고 보나.
공학 교육은 인프라, 즉 교육 기자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우수 인재와 교수만 있다고 학문의 수월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학 교육은 비싼 교육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사실상 인프라 개선에는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100’까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프라에 막혀 ‘80~90’ 밖에 이르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공대 교수들이 이 정도 성과를 이뤄 온 것은 자랑할 만한 점이다.
-교수들이 사회적 발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태생적으로 과학기술계는 다른 분야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하다.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은 다른 그룹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향도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학계에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계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광우병, 멜라민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과학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학적 사건의 본질이 호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핵무기로 인류가 절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1955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에 앞장서 서명했다. 이 선언은 2년 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평화단체인 ‘퍼그워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 과학적 사건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책을 찾아 활동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연합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미 영국에는 ‘BSSRS(British Society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Science)’라는 과학기술인 단체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