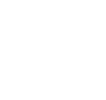언론속의 강태진
`피라미드` `만리장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원 화성`. 이들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당대 최고의 공학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념비적 세계유산이 아니더라도 인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문명의 발전을 유도했던 공학기술을 우리는 도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로 공학기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학기술은 우리 사회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고대 로마제국의 부귀와 영화는 주변 문명보다 탁월했던 공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연 지형이 없는 로마는 방어 목적으로 요새를 축조하고, 성곽 외부의 수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했다. 당시 최고 공학기술로 건설된 로마 시대의 도로망은 원거리로의 신속한 병력과 물자 보급을 가능케 했고, 거대한 영토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실현시켰다.
어느 발굴 조사에 따르면 고대에도 구성 재료만 다를 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기구나 악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도구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인류는 재료를 발명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도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확장시켜 온 것이다. 시멘트가 건축과 토목공학의 신지평을 열어 주었듯이 신소재를 이용한 융합 재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나노튜브는 강철의 100배에 이르는 강도와 구리의 1000배에 이르는 전기전도도를 가지며, 현재보다 1만배 이상 밀집된 반도체 회로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신소재가 상용화되면 교각을 몇 개 세우지 않아도 대한해협을 연결해 일본에 이르는 교량을 건설할 수 있으며, 우주정거장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다. 그야말로 꿈조차 꿔보지 못한 일들이 실현 가능해지는 셈이다.
불과 20여 년 전 통기타를 메고 약속시간이 임박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금의 40대는 이제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감상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친구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비게이터의 발달로 길을 헤매던 것도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공학기술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장면을 급속도로 바꿔놓고 있으며 최근 촛불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체계에서도 정보기술 발달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함께 각광받는 분야도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공학기술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작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은 21세기에서의 성공과 생존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예견했듯이 도구에서 단순한 기능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교류하고 지능을 발현하는 성능이 요구되면서 오히려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됐다. 더 나아가 공학은 금융ㆍ뱅킹 같은 실용 분야뿐 아니라 순수학문과 예술 분야와도 융합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문화의 질까지 향상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공학과 같은 새로운 융합 분야에서 엔지니어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엔지니어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세우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수한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미래는 공학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엔지니어의 양성은 국가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허황되다고 생각되던 꿈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밑바탕에는 언제나 공학이 있었다. 앞선 역사가 공학기술의 역사였듯이 신문명 역시 공학기술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오늘도 묵묵히 연구실과 산업현장을 밤 늦게까지 지키고 있는 우리 공학인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