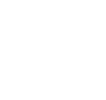언론속의 강태진
2015년 구글은 ‘프로젝트 자카드’(Project Jacquard)를 발표해 패션업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터치스크린이나 터치패드에 들어가 있는 센서의 기능을 직물에 융합해 옷을 터치하면 여러 전자기기가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도레이사와 NTT사는 폴리에스터 나노섬유 원단에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수지를 입힌 ‘히토에 소재’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 ‘히토에 소재’로 옷을 만들면
옷에 부착한 섬유 전극이 생체신호를 측정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입고
다니는 옷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공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공대
학장을 역임한 저자가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알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학’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발전이 공학을 토대로 이뤄졌음에도 공학 자체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래서 그간 공대생의 전유물이란 오해를 받던 공학이 인간과 뗄 수 없는 관계란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책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의에 해당하는 섬유· 패션을
중심으로 풀어낸 공학의 역사와 미래다. 저자가 옷을 중심으로 공학의 다양한 세계를 펼쳐보인 까닭은 이렇다.
인류와 함께 옷이 만들어졌고 진화했으며 옷을 통칭해 근대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뜻의 라틴어 파티오(fatio)에 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방직공장을 돌리면서 촉발됐다. 한국경제도 1960년대와 1970년대 구로공단과
대구·구미·부산 등을 비롯한 섬유산업단지에서 태동하고 발전했다.
저자는 섬유와 의류의 발달사를
들여다보면 공학이 단순히 공장 안에 갇혀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학문이자 인류의
도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IT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지는 옷을 통해 패션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책장을 넘길수록 별 생각 없이 입고 다닌 옷에 공학자의 숱한
시행착오와 노력이 배어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저자의 말대로 사람은 옷 그 이상인 공학을 입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공학 안에 흐르는 인문학과 사회학의 맥락을 찾아낸 저자의 혜안이
돋보인다
김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