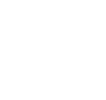언론속의 강태진
섬유 만드는 과정서 싹튼 '工學'
[문화일보]
2016.10.14
패션 이야기일까, 아니면 공학 이야기일까. 책 제목으로 쓴 문장의 주어는 패션이지만, 이 책은 공학을 다룬
교양서다.
그렇다면 왜 하필 패션일까. 섬유공학을 전공한 저자의 설명.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은 공장이란 개념을 낳았는데 당시 공장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 것이 섬유공장이었단다. 옷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옷을 지을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학기술의 혁명이 싹을 틔웠다는
것이다. 곧 섬유산업의 역사가 공학기술의 혁명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인문학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공학을 다루고 있다. 아라크네의 신화 속에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섬유인 거미줄을
끄집어내 섬유로서의 특성과 신소재 연구 이야기를 한다. 이어 직물의 기원에서 패션, 유행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확장해가는 식이다.
이 와중에 저자는 물리학, 철학, 문학, 음악, 미술을 넘나든다.
질 좋은 종이에 올 컬러로 인쇄된 책은 사진도 다양하고 활자 크기도 시원시원하다. ‘공학은 딱딱하다’는
독자들의 선입견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겠지만, 풍성한 사례와 예화만으로도 책은 흥미롭게 읽힌다.
박경일 기자 parking@munhwa.com